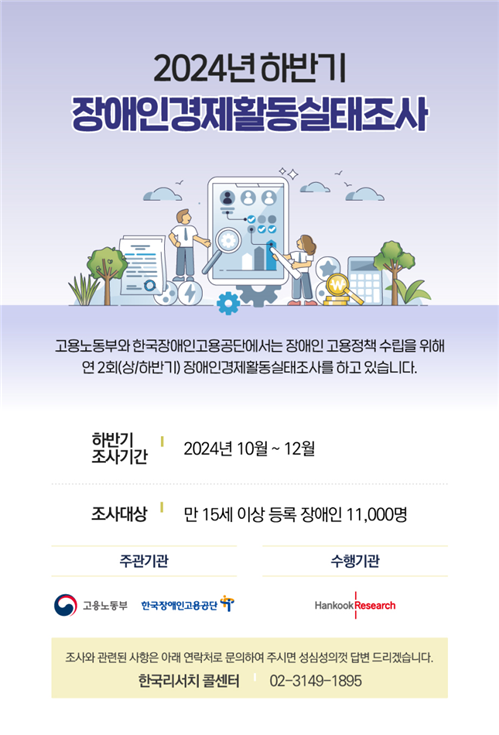지난 6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4 한국다양성포럼(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주최) 현장에 다녀왔다. 이날 여러 기관과 기업, 대학에서 다양성 관련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IBM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다. 성 정체성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놀라웠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에 부럽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이 괜히 글로벌이 아닌 듯했다.
두 번째로 관심이 갔던 건 바로 ‘신경다양성’이었다. 신경다양성은 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투렛 증후권 등 인간의 뇌가 다르게 발달하고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변이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즉, 사람들이 주변 세계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상호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올바른’ 방법은 없으며, 차이점은 결핍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 나은 업무 성과 보인 신경적 소수자들
기업 사례에 따르면, 오히려 신경다양성 차원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들이 더욱 나은 업무 성과를 보여줬다고 한다. 발표자도 자폐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언제쯤 가능할까 고민해 보았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다양성을 고려하는 게 어려울 터이다.
(…)
신경 포용적 인력은 기업에 필수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직장에서 신경다양성이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신경다양성이 있는 직원과 신경 포용적인 인력은 기업에 필수적인 기술과 강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다양성이 있는 개인이 성공하려면 심리적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마저 온갖 편법과 변명으로 거부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는 언감생심이다. 아울러, 심리적 안전은 단기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출처: BRIC